2년 전,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후 집정리를 하던 언니가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아마도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글인 듯했다. 돋보기안경을 쓰고 구부린 자세로 자판 하나하나를 천천히 두들기며 써 내려갔을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먹먹해진다.
문득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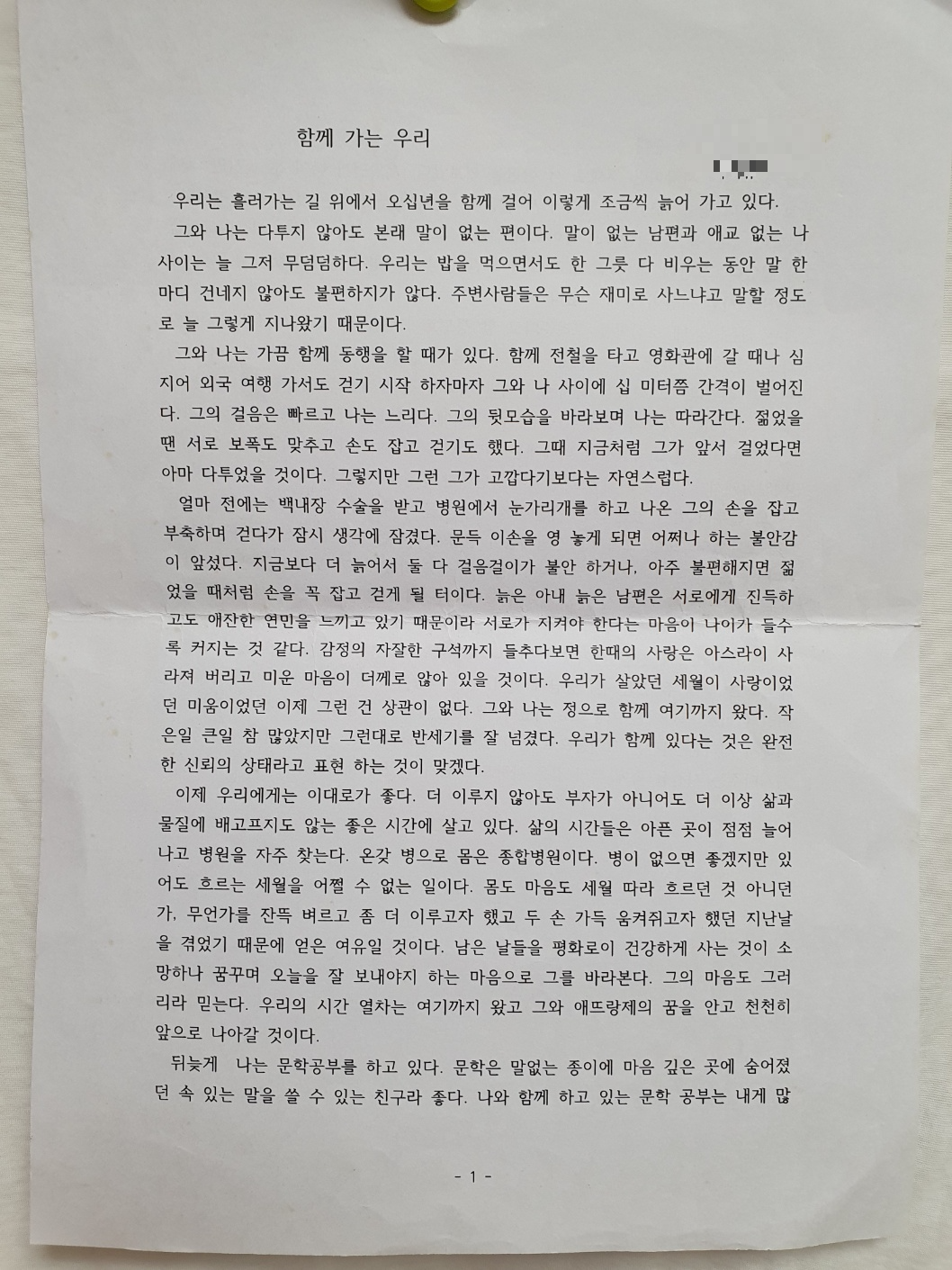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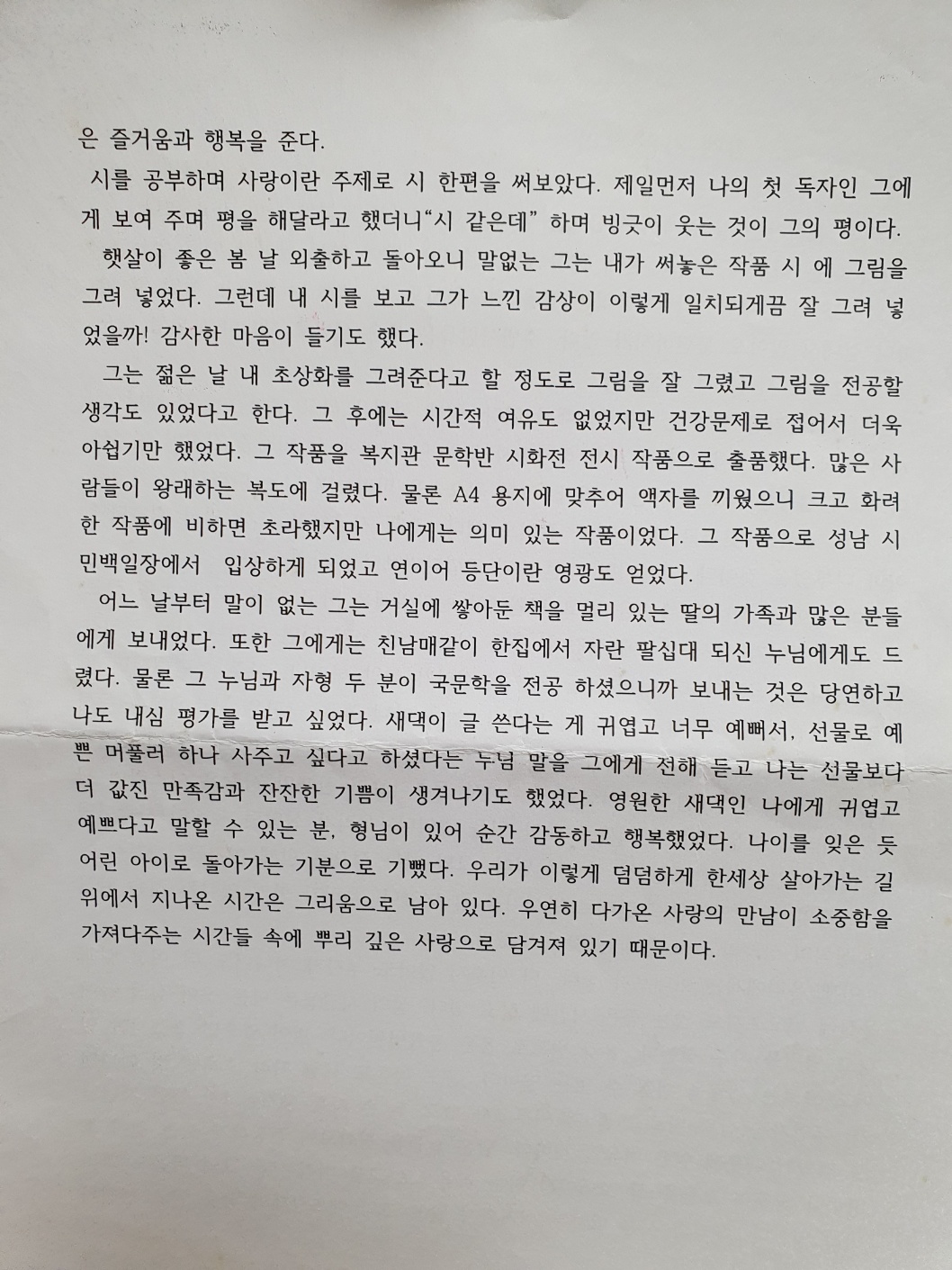
우리는 흘러가는 길 위에서 오십년을 함께 걸어 이렇게 조금씩 늙어 가고 있다.
그와 나는 다투지 않아도 본래 말이 없는 편이다. 말이 없는 남편과 애교 없는 나 사이는 늘 그저 무덤덤하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한 그릇 다 비우는 동안 말 한 마디 건네지 않아도 불편하지가 않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말할 정도로 늘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이다.
그와 나는 가끔 함께 동행을 할 때가 있다. 함께 전철을 타고 영화관에 갈 때나 심지어 외국 여행 가서도 걷기 시작 하자마자 그와 나 사이에 십 미터쯤 간격이 벌어진다. 그의 걸음은 빠르고 나는 느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따라간다. 젊었을 땐 서로 보폭도 맞추고 손도 잡고 걷기도 했다. 그때 지금처럼 그가 앞서 걸었다면 아마 다투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그가 고깝다기보다는 자연스럽다.
얼마 전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눈가리개를 하고 나온 그의 손을 잡고 부축하며 걷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문득 이 손을 영 놓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앞섰다. 지금보다 더 늙어서 둘 다 걸음걸이가 불안 하거나, 아주 불편해지면 젋었을 때처럼 손을 꼭 잡고 걷게 될 터이다. 늙은 아내 늙은 남편은 서로에게 진득하고도 애잔한 연민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서로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것 같다. 감정의 자잘한 구석까지 들추다보면 한때의 사랑은 아스라이 사라져 버리고 미운 마음이 더께로 앉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았던 세월이 사랑이었던 미움이었던 이제 그런 건 상관이 없다. 그와 나는 정으로 함께 여기까지 왔다. 작은 일 큰 일 참 많았지만 그런대로 반세기를 잘 넘겼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완전한 신뢰의 상태라고 표현 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대로가 좋다. 더 이루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더 이상 삶과 물질에 배고프지도 않는 좋은 시간에 살고 있다. 삶의 시간들은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고 병원을 자주 찾는다. 온갖 병으로 몸은 종합병원이다. 병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흐르는 세월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몸도 마음도 세월 따라 흐르던 것 아니던가. 무언가를 잔뜩 벼르고 좀 더 이루고자 했고 두 손 가득 움켜쥐고자 했던 지난 날을 겪었기 때문에 얻은 여유일 것이다. 남은 날들을 평화로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망하나 꿈꾸며 오늘을 잘 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의 마음도 그러리라 믿는다. 우리의 시간 열차는 여기까지 왔고 그와 애뜨랑제의 꿈을 안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뒤늦게 나는 문학공부를 하고 있다. 문학은 말없는 종이에 마음 깊은 곳에 숨어져 있던 속 있는 말을 쓸 수 있는 친구라 좋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문학 공부는 내게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
시를 공부하며 사랑이란 주제로 시 한편을 써보았다. 제일 먼저 나의 첫 독자인 그에게 보여주며 평을 해달라고 했더니 "시 같은데"하며 빙긋이 웃는 것이 그의 평이다. 햇살이 좋은 봄 날 외출하고 돌아오니 말없는 그는 내가 써놓은 작품 시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런데 내 시를 보고 그가 느낀 감상이 이렇게 일치되게끔 잘 그려 넣었을까!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는 젊은 날 내 초상화를 그려준다고 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고 그림을 전공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그 후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건강문제로 접어서 더욱 아쉽기만 했었다. 그 작품을 복지관 문학반 시화전 전시 작품으로 출품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복도에 걸렸다. 물론 A4 용지에 맞추어 액자를 끼웠으니 크고 화려한 작품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 그 작품으로 성남 시민백일장에서 입상하게 되었고 연이어 등단이란 영광도 얻었다.
어느 날부터 말이 없는 그는 거실에 쌓아둔 책을 멀리 있는 딸의 가족과 많은 분들에게 보내었다. 또한 그에게는 친남매같이 한 집에서 자란 팔십대 되신 누님에게도 드렸다. 물론 그 누님과 자형 두 분이 국문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나도 내심 평가를 받고 싶었다. 새댁이 글 쓴다는 게 귀엽고 너무 예뻐서, 선물로 예쁜 머풀러 하나 사주고 싶다고 하셨다는 누님 말을 그에게 전해 듣고 나는 선물보다 더 값진 만족감과 잔잔한 기쁨이 생겨나기도 했었다. 영원한 새댁인 나에게 귀엽고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분, 형님이 있어 순간 감동하고 행복했었다. 나이를 잊은 듯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기뻤다. 우리가 이렇게 덤덤하게 한세상 살아가는 길 위에서 지나온 시간은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 우연히 다가온 사랑의 만남이 소중함을 가져다 주는 시간들 속에 뿌리 깊은 사랑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들의 연주회 (0) | 2025.01.23 |
|---|---|
| (허겁지겁) 2024년 정리 (1) | 2025.01.20 |
| Camp Yawgoog (2024) (2) | 2024.09.14 |
| Canobie Lake Park (3) | 2024.09.07 |
| 되돌아보는 6월 (6) | 2024.09.03 |



